Archive Page 6
다시 또 토요일
가족이 없이 싱글로 사는 것은 꽤나 피곤한 일이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때 인사할 사람이 있는 것,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겼을 때 같이 갈 사람이 있는 것, 이런 당연하고 사소한 일들이 모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된다. 친구와 즐겁게 술 한 잔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도, 메워지지 않는 쓸쓸함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닌다.
토요일인 오늘은 모교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다녀왔다. 올해는 MIT가 보스턴(Boston) 시에서 케임브리지(Cambridge) 시로 이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다. 어제 있었던 졸업식에서는 영화배우 맷 데이먼(Matt Damon)이 졸업 축사를 해서 화제가 되었다. 영화 굿윌헌팅(Good Will Hunting)에서 그는 내가 5년간 몸담았던 MIT 수학과에서 청소부 일을 하는 천재 역을 맡았다. 학부생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보스턴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것을 꿈꾸곤 했었다.
박사 학위를 받은지 벌써 3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그나마 몇 남지 않은 친구들, 후배들이 또 이 곳을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SNS에 잔뜩 올라오는 졸업식 사진들을 보면서 3년 전 그 날의 기억들을 떠올린다. 이제는 정말 이 곳을 떠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졸업 후 취직하지 않고 수학 공부를 계속 했었다면 지금쯤 첫 번째 Postdoc 계약이 끝났을 시간이다 ─ 성과가 좋았다면 어딘가에 조교수 자리를 잡아 ‘교수님’ 소리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다음 연구원 자리를 찾아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테지.
학교 잔디밭을 꽤나 근사하게 꾸며 놓고 오픈바(술을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다)에 마카롱, 컵케잌, 쿠키 등을 제공하는 파티가 있었다. MIT 이사 100주년을 기념하고 올해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자리이다. 보스턴과 케임브리지를 가로지르는 찰스(Charles) 강에서 폭죽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상그리아를 조금 과하게 마셔서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집에 가지 못 하고 혼자 학교 근처 주차장에 앉아 이 글을 쓴다.
자동차 안에 앉아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차를 살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스피커 만큼은 많이 신경을 썼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롭지만 차 안에 있으면 신기하게도 외롭지 않다. 한국에 있을 때에도 차 안에서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문을 잠그고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마치 가족의 품에 안겨 있는 듯 따뜻하다.
지금도 가끔 떠올리는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 있다. 우리 가족이 서울 근교의 섬에 놀러갔을 때다. 그 날은 흐리고 비가 많이 왔다. 조개가 잔뜩 들어간 칼국수를 배불리 먹고, 자판기 커피를 하나씩 들고 자동차 안에 들어와 라디오를 들으며 비에 젖은 서해 바다를 바라봤다. 그 때의 기억 때문에 여전히 비 오는 바닷가를 좋아한다. 그만큼 행복한 기억을 앞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껏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일이 잘못 되었더라도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이 학교의 졸업생이 되지 못 했을 것이고,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8년간 살지 못 했을거다. 지금은 일상이 된 것들이 이십대 초반의 나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뜻한 집이 있고 아직까지는 흥미로운 직장이 있고 차가 있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가 생각날 때 마음껏 마실 수 있다. 행복하기에 충분하다.
어젯밤 읽었던 볼테어(Voltaire)의 풍자 소설 Candide (원제: Candide, ou l’Optimisme)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려 본다. 이제 자정이 다 되어 간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All that is very well, but let us cultivate our garden.”
몬트리올 여행 2부
(첫 번째 글을 적고 나서 벌써 4달이 지났네요. 혹시 읽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그 동안 좀 바빴어요..)
운전을 오래 한 덕분에 크리스마스 날 밤에는 Airbnb 숙소에 들어가자 마자 바로 깊은 잠에 들었다. 저녁 열한 시에 잠에 들어 다음 날 아침 여덟 시쯤 서늘하고 낯선 공기에 눈을 뜨면서, 올해 들어 이렇게 상쾌하게 일어난 적이 있었나 싶었다. 2015년은 마음가짐이 많이 복잡했던 해였다. 익숙하고 따뜻한 내 집보다 타지의 춥고 좁은 방 하나가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여행 이튿날인 오늘은 예전 추억을 더듬어 가는 날로 정했다. 아마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귀찮아서 그랬으리라. 6년 전 몬트리올로 당일치기 여행을 왔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Old Montreal (Vieux-Montréal) 에서 보냈었다.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적당한 곳에 내려서 Old Montreal의 중심가로 걸어왔다. 오늘은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이면서 토요일이라 여전히 성탄 연휴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어제 밤보다는 조금 많아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식당에는 Fermé (Closed) 라고 쓰인 간판이 걸려 있다. 한숨을 푹 쉬며 근처 맥도날드에 들어가 끼니를 떼우고 주변에 스타벅스를 찾아가 혈관에 카페인을 채우고는 정신을 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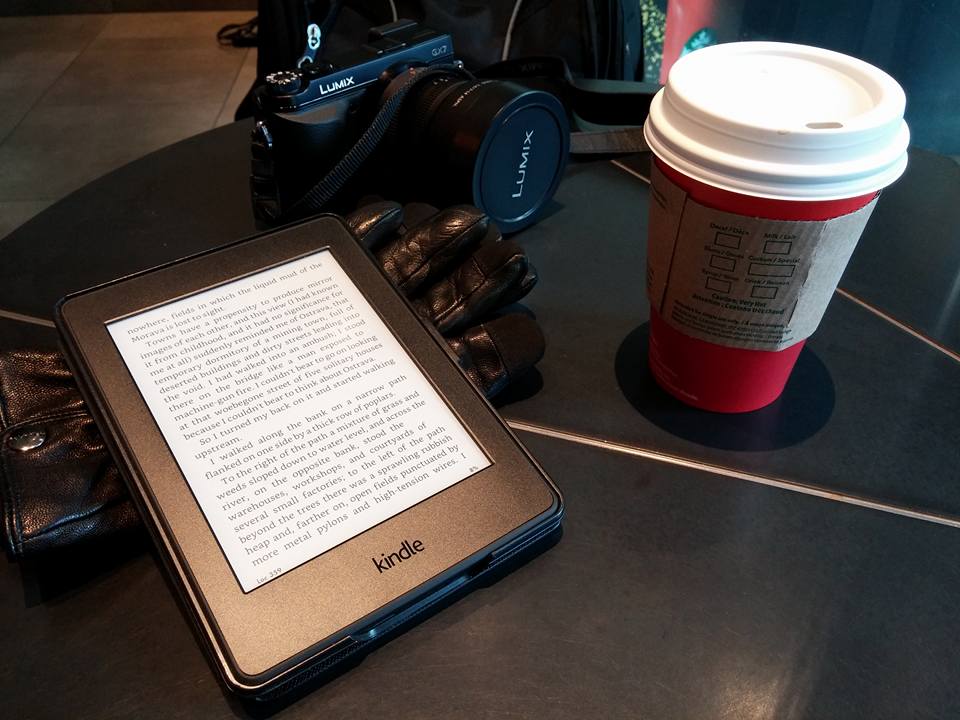
@ 474 Rue McGill, Montréal, QC, Canada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위의 사진과 함께. 청승맞게 혼자 여행을 왔을지언정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아야 하니까.. (“American trash”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 한 시간 정도 책을 읽고 있자니 창 밖에 햇살이 조금 든다. 다시 짐을 챙기고 대성당 쪽으로 발을 옮겼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 도시에 오는 모든 여행객들이 첫 번째로 들르는 곳이다. 아늑한 스타벅스를 찾으려고 너무 멀리 왔는지 대성당까지 꽤 걸었다. 가는 길에 적적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잘 사진으로 담기지가 않는다. 사진은 2-3년 전부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취미생활인데 올해에는 참 안 된다. 기본기가 여전히 부족하고 구성도 더 많이 공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의욕이 없어진 것이 문제.. 그래서 자연스레 관찰력도 떨어진 듯하다. 여행을 떠나오면 자연스럽게 영감(?)이 떠오르진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말이다.

대성당의 위용은 여전하다. 최근에 장만한 환산 14mm 광각 렌즈로 겨우 한 프레임에 담았다. 물론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지난 번에 이 성당을 보러 왔을 때 생각을 하며 잠깐 몽상에 잠겼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늘 오후 5시에 미사가 있다고 쓰여 있다. 그나마 프랑스어로 요일 정도는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지난 번에 왔을 때는 그냥 입장료 받는 관광지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매일 미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내 개인 정보의 종교란에 ‘천주교’라고 적다가 ‘무교’로 쓰게 된지 좀 되었는데, 염치 불구하고 미사에 참석하기로 한다. 아침에 일찍 출발했더니 아직 저녁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았다. Old Montreal을 천천히 다시 돌아보고 St. Lawrence 강변을 따라 계속 걸었다.







한참 강 주위를 걷다가,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질 무렵 St. Denis 거리를 따라 강 반대편으로 걸어 올라오니 UQÀM 대학과 퀘벡주 공립 도서관이 나온다. 이 지역은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음식점이 많고 활기찬 분위기다. 근처에 문을 연 바에 들어가 맥주 한 잔과 닭고기 꼬치구이 하나를 시켜 먹고 있자니 벌써 미사가 시작할 시간이 다 되었다. 다시 온 길을 부랴부랴 뛰어가서 오분쯤 늦게 성당에 도착했다. 다행히 문을 지키는 분이 들여보내 주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 Basilique Notre-Dame de Montréal
다행히 아직 입당 성가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다. 급하게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리고 보니 눈 앞에 펼쳐진 금색과 파란색의 조화에 정신을 빼앗겼다. 이 곳은 정말 아름답다.. 신부님이 먼저 간단한 영어 인사로 세계 각지에서 대성당을 찾아온 나 같은 타지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다. 아마 성탄절이었던 어제는 무척 붐볐을 터인데 오늘은 차분하고 따뜻하다.
난생 처음으로 프랑스어로 미사를 본다. 주위로 고개를 돌려 보니 대충 누가 나처럼 외지에서 왔는지 눈에 보인다. 내 바로 뒤에서는 미국인 고등학생 쯤으로 보이는 금발의 자매가 따분한 표정으로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 거린다. 앞에 왼쪽에는 중국인 4인 가족이 나처럼 멍하니 성당을 둘러보고 있다. 영성체 의식을 할때 잠시 일어났다 앉으니 스페인어로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다. 무척이나 생경한 풍경인데도 낯설지가 않고 마치 중학생 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성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말은 거의 알아듣지 못 하지만 어떤 의식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낯선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유대감, 친밀함은 종교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미사를 끝마치고 나와 대성당 옆의 찻길에 한참동안 서서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없이 찾을 수 있는, 흔하고 뻔한 노트르담 성당의 야경 사진이 될 테지만, 그냥 내 기억 속에 더 깊이 남겨두고 싶어서 계속 찍는다. 귓바퀴를 때리는 바람이 무척 차갑다.
왜인지 허전한 기분이 들어 성당 근처의 허름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캐모밀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마저도 휴일이라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다. 주변을 서성거리며 걷다 보니 차이나타운 근처에 와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저녁밥을 아직 안 먹었다. 휴대폰을 꺼내 보니 근처에 맛있는 국수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한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여행을 했었더라..

@ Nouilles de Lan Zhou, 1006 Boul St-Laurent, Montréal, QC, Canada
이 집의 “beef noodle soup”는 제법 괜찮았다. 춥고 배고프고 하루 종일 걸었으니 무얼 먹었어도 맛있었겠지만..
식당에 자리가 비좁아 아저씨 한 분과 합석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게 됐다. 중국어는 못 하는 것 같은데 아시아계 미국인이고 시카고에서 왔다고 한다. 이 분은 어떤 사연으로 연말 연휴에 이 추운 곳을 혼자 여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묻지는 않고 여행 이야기, 사진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정리한다. 아저씨는 국물이 너무 맛있다며 연신 칭찬을 한다. 주방에 부탁해서 서너번을 국물만 더 받더니 국수 면은 절반 가까이 남겼다. 각자 계산서를 받고 나서 아저씨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밤에 먹을 간식을 조금 샀다. 지하철에서 내려 눈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자니,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과 오늘이 아니었던 날들의 기억이 머리속을 가득 채운다. 오늘 밤에는 어제처럼 금방 잠들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계속)
Like someone who has never waved
“We agreed I’d send a postcard to let her know when I had my next leave and could see her. We said good night (without kissing or touching) and I walked away. After a few steps I turned and saw her standing in the doorway, not unlocking the door, just standing there watching me; only then, when I was a little way off, did she drop her reserve and allow her eyes (so timid before) to fix me in a long stare. Then she lifted her arm like someone who has never waved, who doesn’t know how to wave, who only knows that when one person leaves, the other person waves, and did her awkward best to make the gesture. I stopped and waved back, and we stood there looking at each other. Then I started off again, stopped once more (Lucie’s hand was still going), and went on, starting and stopping, until finally I turned the corner and we vanished from each other’s sight.”
– Milan Kundera, The Joke.
 RSS
RSS

